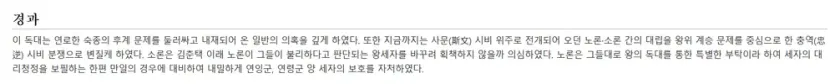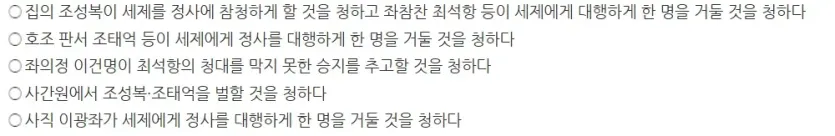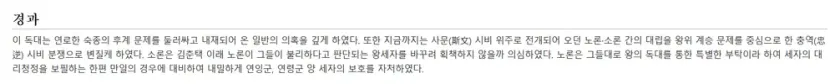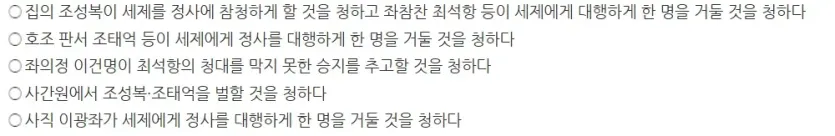여기서 게장과 생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다들 알거라고 생각한다 경종독살설얘기다
사실 게장과 생감을 같이 먹으면 정말로 몸에 안좋은가?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
왜냐면 경종이 살던 시대는 300년 전이고 그 당시의 위생과 환경 음식은 지금과는 모든게 다르기때문이다
여기서는 왜 경종독살설이 지금까지 유지되는지에 대한 경과만 알아보자
기起. 경종의 불안한 정치적 입지
경종의 생모는 희빈 장씨로 장희빈의 집안은 역관출신으로 중인이었으나 남인과의 친분을 이유로 경신환국때 종숙부가 형벌을 받는 등 남인과 정치적 인연이있는 집안이었다 따라서 경종 역시 남인계로 분류된다
문제는 경종에게 힘이 되어줄 남인계와 집안이 갑술환국으로 몰락하면서 개박살이났다는것인데 거기에 더해 장희빈에게서 마음이 완전히 떠난 숙종은 경종까지 미워하기 시작한다
(소론은 김춘택 이래 노론이 그들이 불리하다고 판단되는 왕세자를 바꾸려 획책하지 않을까 의심하였다. 노론은 그들대로 왕의 독대를 통한 특별한 부탁이라 하여 세자의 대리청정을 보필하는 한편 만일의 경우에 대비하여 내밀하게 연잉군, 연령군 양 세자의 보호를 자처하였다.)
숙종과 노론 영수인 이이명의 정유독대 뒤엔 그 의도가 더욱 노골적으로 변하는데 '노론이 그들이 불리하다고 판단되는 왕세자' 라는 말에서 짐작이 가듯이 당시 여당인 노론과 경종은 경종과 정치적 입장이 반대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승承. 연잉군의 대두
우여곡절끝에 숙종이 죽고 왕이 된 경종이었지만 경종은 허수아비처럼 숨만쉬고 있었으며 또한 31세의 경종은 아직도 후사가 없었다
이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는데 당장 33세 재위 15년차에 승하한 현종의 아들이 숙종이었고 그 숙종의 나이가 즉위당시 12세였다
마찬가지로 31살인 경종도 언제 훅갈지 모르는 일이고 만약 그렇게된다면 후사가 없으므로 심각한 혼란이 일어날 것이 자명했으므로 후계를 정하는것이 급선무인 상황이 된 것이다
그래서 노론은 정유독대에서 출발한 연잉군을 밀기 시작한다
임금은 평소에 병이 많아 계사(繼嗣)를 두기가 어렵게 되었으니, 국세(國勢)는 위태하기가
철류(綴旒)
와 같았다.
삼종(三宗)
의 혈맥으로는 다만 주상과 아우 한 분이 있으니 천명(天命)과 인심의 스스로 귀착(歸着)되는 바가 저군(儲君)이 아니고 누구이겠는가? 이제 종사(宗社)의 대계(大計)가 이미 정해졌으니
명명(明命)
이 한 번 내려지자 온 나라 사람이 기뻐하지 않는 이가 없었다. 그러나 당일 대신들은 조정에 모여 의논을 꺼내려 하지 않았고, 또 교외(郊外)에 있는 동료 대신에게도 알리지 않았으며, 다만 4, 5인의 재정(在廷) 동료와 함께 깊은 밤중에 청대(請對)하여 광명 정대한 일로 하여금 전도(顚倒)와 솔략(率略)함을 면하지 못하게 하였으며, 심지어 임금의 뜻은 물어보지도 않고서 반드시 자성(慈聖)의 수필(手筆)을 얻은 후에라야 봉행(奉行)하겠다고 말한 것이 어찌 연석(筵席)에서 주사(奏事)하는 체통이라 하겠는가? 이때에 임금은 오래도록 혼전(魂殿)의 향사(享祀)에 친제(親祭)치 않았고, 상제(祥祭) 후에도 아직껏 산릉(山陵)에 전알(展謁)하지도 못했으므로 군신들이 여러 번 말을 하였었는데, 이날은 갑자기
명릉(明陵)
을 전알(展謁)하겠다는 명을 내렸었다. 이것은 마땅히 여러 사람의 마음에 함께 기뻐하여야 할 일인데도
김창집
은 정섭(靜攝)에 지장이 있다는 이유로써 탑전(榻前)에서 중지할 것을 청하였으니, 사람들이 이 일로써 더욱 그를 의심하였다.
경종실록 4권, 경종 1년 8월 20일 무인 3번째기사
https://sillok.history.go.kr/id/kta_10108020_003
노론은 통금이 시행되는 한밤중에 찾아와 연잉군을 세제로 삼으라고 압박했고
(
그러나 당일 대신들은 조정에 모여 의논을 꺼내려 하지 않았고, 또 교외(郊外)에 있는 동료 대신에게도 알리지 않았으며, 다만 4, 5인의 재정(在廷) 동료와 함께 깊은 밤중에 청대(請對)하여 광명 정대한 일로 하여금 전도(顚倒)와 솔략(率略)함을 면하지 못하게 하였으며
)
또한 장성한 경종이 있으므로 엄연한 불법인 대비의 정사개입까지 이루어졌다
(
심지어 임금의 뜻은 물어보지도 않고서 반드시 자성(慈聖)의 수필(手筆)을 얻은 후에라야 봉행(奉行)하겠다고 말한 것이 어찌 연석(筵席)에서 주사(奏事)하는 체통이라 하겠는가
)
이로서 사방이 막힌 경종은 연잉군을 세제로 책봉하게된다
뒤늦게 이 일을 알게된 소론으로서는 연잉군의 세제책봉을 막을 수 없었다
상소가 승정원에 이르자 승지
한중희(韓重熙)
가 청대(請對)하여 소를 가지고
진수당(進修堂)
으로 들어갔다. 임금이
한중희
에게
유봉휘
의 소를 읽으라 하였다. 읽기를 마치고
한중희
가 말하기를,
"성명(成命)이 이미 내려졌고 저위(儲位)가 이미 정해졌으니, 신하된 자가 감히 용이하게 말할 일이 못되는데도
유봉휘
의 이러한 상소가 있으니 주상께서는 준례에 따라 비답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마땅히 대신과 삼사(三司)의 관원을 불러 물어보고 처분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자성(慈聖)에게 품하고서 처분하겠다고 하교하고
한중희
에게 상소를 두고 나가라 하였다.
경종실록 4권, 경종 1년 8월 23일 신사 3번째기사
https://sillok.history.go.kr/id/kta_10108023_003
그리고 세제 책봉으로 자신감을 얻은 노론은 더욱 막나가기 시작하는데 이제는 대리청정을 요구하기 시작한다
집의(執義)
조성복(趙聖復)
이 상소하기를,
"전하께서 종사(宗社)의 큰 계책을 생각하시고
인심(因心)
의 지극한 사랑을 미루어, 위로는 선왕(先王)의 뜻을 체득하고 안으로는 자전(慈殿)의 뜻을 품(稟)하시어 국본(國本)을 빨리 정하여 능히 원량(元良)을 맡기셨으니 전하의 이러한 거조는 진실로 백왕(百王)보다 탁월하시며 사첩(史牒)에서도 보기 드문 바입니다. 다만
이연(离筵)
의 권강(勸講)이 진실로 오늘날 급무이니, 마땅히 춘궁(春宮)을 면려(勉勵)하여 서연(書筵)의 법강(法講)을 혹시라도 정지하지 말고, 비록 재계(齋戒)하는 날을 당할지라도 곧 요속(僚屬)을 불러 서사(書史)를 토론하여
십한 일폭(十寒一曝)
의 근심이 없게 하소서.
일찍이
선조(先朝) 정축년
무렵에 조정 신하가, ‘신하를 인대(引對)하는 즈음에 전하로 하여금 곁에서 모시고 참여해 듣게 하여 나라 일을 가르치고 익히도록 하라.’는 뜻으로 글을 올려 청한 적이 있었는데, 신은 이 말을 한 사람이 저군(儲君)을 교도하는 법을 진실로 알았다고 생각합니다. 전하께서는 그때 아직 나이가 어렸으나 오히려 이렇게 말하였는데, 오늘날 동궁은 장성한 나이가 전하의 당년보다 갑절이 될 뿐만 아니니, 서정(庶政)을 밝게 익히는 것이 더욱 마땅히 힘써야 할 급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전하께서 신료(臣僚)를 인접(引接)하실 즈음이나 정령(政令)을 재결하는 사이에 언제나 세제(世弟)를 불러 곁에 모시고 참여해 듣게 하고, 가부(可否)를 상확(商確)하며 일에 따라 가르쳐 익히게 한다면, 반드시 서무(庶務)에 밝고 익숙하여 나랏일에 도움되는 바가 있을 것입니다. 엎드려 원하건대 전하께서는 성의(聖意)를 깊이 두시고 우러러 자지(慈旨)를 품(稟)하여 진퇴(進退)하소서."
경종실록 5권, 경종 1년 10월 10일 정묘 1번째기사
https://sillok.history.go.kr/id/kta_10110010_001
8월 23일에 세제를 임명하고 불과 2달도 지나지 않은 10월 10일에 세제의 대리청정 요청까지 나온 것은 경종이 평소 몸이 약하긴 했으나 어쩄든 지금당장 누워있는것도 아니고 재위기간동안 허수아비처럼 보여도 국사를 처리하고있었던 현왕 경종을 명백히 엿먹이는 행동이었다
그리고 이번에는 세제책봉때처럼 소론이 멍청하게 가만히있진 않았다
소론이 들고 일어나자 노론은 경종을 떠보기 시작하는데,
영의정
김창집(金昌集)
이 차자(箚子)를 올려
치사(致仕)
를 청하니, 허락하였다.
김창집
은
숙종(肅宗)
때부터 오랫동안 국권[國柄]을 잡아 권세가 중외(中外)에 기울었는데, 임금이 즉위하자 청단(聽斷)에 권태(倦怠)를 느꼈으므로, 국사의 크고 작은 것이 모두
김창집
에게서 결정되었다. 그 당(黨)으로 붙좇는 자가 날로 많아 지고 인심이 갈수록 더욱 분개하고 미워하니
김창집
도 하루아침에 그 지위를 잃고 필시 화(禍)가 미칠 것을 염려하여 항상 두려워하였다. 그러나 세제(世弟)를 세운 뒤에는 스스로, ‘큰 공을 이미 이루었으니 부귀를 길이 보존할 수 있다.’고 하여 드디어 걸해(乞骸)하는 글을 올려 물려갈 뜻을 보였다. 하지만 실제로는 본래 물러갈 뜻이 없었는데, 차자가 들어가자 임금이 갑자기 그 청함에 따르니, 그 당이 크게 놀라고 두려워하였다. 좌의정
이건명(李健命)
·판부사(判府事)
조태채(趙泰采)
·간관(諫官)
어유룡(魚有龍)
등이 각각 차자를 올려 치사의 명을 도로 거두기를 청하였으나, 임금이 모두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경종실록 5권, 경종 1년 10월 11일 무진 5번째기사
https://sillok.history.go.kr/id/kta_10110011_005
당시 최고실세였던 김창집이 예의상 사직서를 제출하자 경종은 바로 사직서를 수리해버린다
그러면서 동시에 경종은 노론이 요청한 대리청정을 수락해버리며 정국은 미궁으로 빠져들게된다(
https://sillok.history.go.kr/id/kta_10110013_004
)
상황이 예측이 되지 않게되자 노론과 연잉군은 대리청정을 거둘것을 계속 요청했고(
https://sillok.history.go.kr/id/kta_10110013_005
,
https://sillok.history.go.kr/id/kta_10110014_003
,
https://sillok.history.go.kr/id/kta_10110015_007
)
경종은 대리청정을 거두게 된다(
https://sillok.history.go.kr/id/kta_10110017_002
)
전轉. 연잉군의 몰?락
아!
《춘추》
를 이 세상에 강(講)하지 아니한 지 오래인지라, 작은 것을 막지 아니하고 싹을 자라게 하여 삼강(三綱)과 오륜(五倫)이 무너짐이 오늘날과 같은 적은 없었습니다.
조성복(趙聖復)
이 앞에서 불쑥 나왔는데도 현륙(顯戮)하는 법을 아직 더하지 아니하였고, 사흉(四凶)이 뒤에 방자하였는데도 목욕(沐浴)하고 토죄(討罪)할 것을 청한 것을 아직 듣지 못하였으며, 임금의 형세는 날로 외롭고 흉한 무리는 점점 성하여 다시 군신(君臣)의 분의(分義)가 없으니, 사직(社稷)이 빈 터가 되는 것은 다만 다음에 있을 일일 뿐입니다. 전일의 일은 종사(宗社)에 망극(罔極)하니, 천고(千古)로 거슬려 올라가도 듣지 못한 바이며 국사[國乘]에도 보지 못한 바입니다. 오늘날 조정 신하가 진실로 전하께 북면(北面)하는 마음이 있다면, 모두 대궐 뜰에 엎드려 머리를 부수고 간(肝)을 가르며 비록 해와 달을 넘길지라도 차마 갑자기 물러갈 수 없는 것이 곧 하늘과 백성의 그만둘 수 없는 떳떳한 도리입니다. 그런데 복합(伏閤)·정청(庭請)으로 겨우 책임이나 면하고 3일 만에 연명(聯名)으로 차자(箚子)를 올려 마음대로 재정(裁定)하고는, ‘신자(臣子)가 어찌 감히 가볍고 갑작스러움에 구애받아 한결같이 모두 어기고 거역하겠습니까?’라고 하였고, 또 말하기를, 빨리 유사(有司)로 하여금 절목(節目)을 거행하도록 하소서.’라고 하였으니, 이것이 어찌 인신(人臣)으로서 감히 마음속에 품었다가 입 밖에 낼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조성복
과 더불어 머리와 꼬리로 호응하며 서로 표리(表裏)가 된 형상을 환히 볼 수 있습니다. 순식간에 일이 장차 헤아리기 어렵게 되었는데, 만약 밖에서 새로 들어온 대신이 몸을 잊고 목숨을 잊고 사직(社稷)에 바쳐 천폐(天陛)에 머리를 조아려 면대해 옥음(玉音)을 받들지 아니하였더라면, 나라가 나라답게 될 것을 헤아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경종실록 5권, 경종 1년 12월 6일 임술 1번째기사
https://sillok.history.go.kr/id/kta_10112006_001
그러나 김일경을 필두로한 소론 강경파는 가만히있지 않았고 김창집, 이이명, 이건명, 조태체 노론 4대신을 4흉凶으로 칭하며 노론을 역적으로 토죄하기 시작했다
사신(史臣)은 말한다. "주상께서 즉위하신 이래 공묵(恭默)하여 말이 없고 조용히
고공(高拱)
하여서 신료(臣僚)를 인접(引接)하여 더불어 수작하지 아니하고 군하(群下)의 진품(陳稟)을 문득 모두 허락하니, 흉당(凶黨)이 업신여겨 두려워하고 꺼리는 바가 전혀 없었으므로 중외에서 근심하고 한탄하며 질병이 있는가 염려하였다. 그런데 이에 이르러 하루밤 사이에 건단(乾斷)을 크게 휘둘러 군흉(群凶)을 물리쳐 내치고 사류(士類)를 올려 쓰니, 천둥이 울리고 바람이 휘몰아치며 하늘과 땅이 뒤집히는 듯하였으므로, 군하가 비로소 주상이 숨은 덕을
도회(韜晦)
함을 알았다."
경종실록 5권, 경종 1년 12월 6일 임술 7번째기사
https://sillok.history.go.kr/id/kta_10112006_007
이에 힘입은 경종은 노론을 내치며 소론을 업고 친정시대를 연다
자신의 지지층인 노론이 순식간에 개박살나며 고립된 연잉군 그러나 그에게도 아직 동앗줄이 남아있었다
소론은 강경파와 온건파로 갈라지며 강경파는 경종을, 온건파는 연잉군을 지?지하기 시작한 것이다
왕세제가 궁관에게 이르기를,
"한두 환관이
작용(作俑)
하여 나를 제거하려 하자, 자성(慈聖)께서 나로 하여금
대조(大朝)
께 들어가 고하게 하시므로 내가 울면서 대조께 청하였는데, 처음에는 나추(拿推)하라 명하셨다가 돌아서서 또 도로 거두셨다. 이 일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그만이지만, 이미 발생한 뒤에는 임금 곁에 있는 악한 자를 없애지 않을 수 없어서 다시 진달하였더니, 갑자기 감히 듣지 못할 하교를 내리셨다. 내가 장차 합문(閤門)을 나가 거적을 깔고 죄를 기다리며 사위(辭位)하려 하므로 강관(講官)에게 나의 거취(去就)를 알리려는 것이다."
경종실록 5권, 경종 1년 12월 22일 무인 5번째기사
https://sillok.history.go.kr/id/kta_10112022_005
조태구
가 말하기를,
"어젯밤 동궁(東宮)이 궁료(宮僚)에게 영(令)을 내리기를, ‘한두 환관이 중간에서 작용(作俑)하여 문안과 시선(視膳)도 또한 막히는 데 이르렀으므로 눈물을 흘리며 진달하였더니, 처음에는 나추(拿推)하라는 명이 있었으나 즉시 도로 거두고 이어 엄한 하교를 내리시므로, 장차 합문(閤門)을 나가 진소(陳疏)하고 대죄(待罪)하여 사위(辭位)하고자 한다.’고 하였다 합니다. 신은 알지 못하겠습니다만 무슨 까닭으로 이 지경에 이르렀고, 또한 어찌하여 갑자기 나추(拿推)의 명을 정지하셨는지요? 옛사람은 환관을 가노(家奴)에 비유하였으니 시험삼아 사가(私家)의 경우로 말해 보건대 종의 말을 듣고 형제가 화합하지 않는다면 그 집이 흥하겠습니까, 망하겠습니까? 전하께서는 어찌하여 일개 집안의 종을 아끼시어 즉시 엄히 국문하여 동궁의 마음을 위로하지 않으십니까?"
하고,
최석항
은 말하기를,
"예로부터 성왕(聖王)이 효우(孝友)를 근본으로 삼지 않은 경우가 없었습니다. 더욱이 선왕(先王)의 골육이라고는 단지 전하와 춘궁(春宮)만 계시고, 새로 저사(儲嗣)를 세워서 국본(國本)이 크게 안정되었는데, 한두 환관이 감히 이간하여 춘궁을 불안하게 하였습니다. 춘궁의 마음이 불안하다면 하늘에 계시는 선왕의 영(靈)이 어찌 슬퍼하지 않겠으며, 자전(慈殿)의 사랑하시는 생각 또한 어찌 민망스러워하지 않겠습니까? 종사(宗社)가 보존되느냐 망하느냐의 기틀이 호흡지간(呼吸之間)에 박두해 있으니, 청컨대 빨리 국청(鞫廳)을 설치하여 엄하게 핵실하고 실정을 알아내어 법(法)을 바로잡으소서."
하였으며, 여러 신하도 차례로 힘써 청하였다.
심단(沈檀)
이 말하기를,
"세제(世弟)께서 ‘내 몸을 제거하려고 한다.’는 말씀까지 있었으니, 이 무리는 대역(大逆)의 죄에 관계됩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국문할 필요없이 빨리 방형을 시행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하니, 여러 신하들이 모두
심단
의 말이 옳다고 하였다.
임금이 끝내 답하지 않았다.
이조(李肇)
가 나아가 아뢰기를,
"여러 신하들이 힘써 청하는 것이 이와 같으니 적발하여 정법(正法)하도록 하교하시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수답(酬答)이 있는 것 같았으나 그래도 명백하지 않았다.
조태구
가 다시 청하기를,
"소신(小臣)의 들음이 명백하지 못하니, 옥음(玉音)을 자세히 듣기를 원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적발하여 정법하라."
경종실록 5권, 경종 1년 12월 23일 기묘 2번째기사
https://sillok.history.go.kr/id/kta_10112023_002
노론이 세운 세제인 연잉군을 경종이 좋아하지 않았을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을것이다
그러던중 세제궁의 환관들이 세제를 시해하려했다는 초유의 사태가 터진다
말도안되는 대역죄에 경종은 '처음에는 나추(拿推)하라는 명이 있었으나 즉시 도로 거두고 이어 엄한 하교를 내리시'는 대처를 한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조진다고 말하고 뒤돌아서니 하지말라고하며 다시 말하자 쌍욕을했다는것이다
또한 신하가 죄다 처벌을 요청하자 우물쭈물하면서 어쩔수없이 처벌을 명하는걸로 보아 경종과 연잉군의 관계가 좋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그러던중 목호룡사건이 터진다
목호룡(睦虎龍)
이란 자가 상변(上變)하여 고(告)하기를,
"역적(逆賊)으로서 성상(聖上)을 시해(弑害)하려는 자가 있어 혹은 칼이나 독약(毒藥)으로 한다고 하며, 또 폐출(廢黜)을 모의한다고 하니, 나라가 생긴 이래 없었던 역적입니다. 청컨대 급히 역적을 토벌하여 종사(宗社)를 안정시키소서."
하고, 또 말하기를,
"역적 중에 동궁(東宮)을 팔아 씻기 어려운 오욕을 끼치려 하는 자가 있습니다. 역적의 정상을 구명(究明)해서 누명(累名)을 씻어 국본(國本)을 안정시키소서."
하였다. 승지(承旨)
김치룡(金致龍)
등이 변서(變書)를 가지고 입대(入對)하여 왕옥(王獄)에 회부하고 대신(大臣)을 불러서 처리하게 할 것을 청하니, 드디어
내병조(內兵曹)
101)
에 정국(廷鞫)을 설치하였는데,
목호룡
이 공칭(供稱)하기를,
"저는 비록 미천(微賤)하지만 왕실(王室)을 보존하는 데 뜻을 두었으므로, 흉적(凶賊)이 종사(宗社)를 위태롭게 만들려고 모의하는 것을 눈으로 직접 보고는 호랑이 아가리에 미끼를 주어서 비밀을 캐낸 뒤 감히 이처럼 상변(上變)한 것입니다.
경종실록 6권, 경종 2년 3월 27일 임자 2번째기사
https://sillok.history.go.kr/id/kta_10203027_002
목호룡이라는 자는 경종을 시해하는 3가지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그 역적모의에 연잉군이 연루되어있다며 폭로한다
'호랑이 아가리에 미끼를 주어서 비밀을 캐냈다' 라고 하는데 이는 자신이 내부 고발자라는 의미였고 경종은 이를 받아들여 노론을 가루로만들기 시작한다
결結. 경종의 사망
사인(士人)
이공윤(李公胤)
은 성질이 광망(狂妄)하였으나 의업(醫業)으로 명성이 있었는데, 그의 의술은 대체로
준리(峻利)
를 위주로 하였다.